소설 게시판

- 뽐내기 > 소설 게시판
영혼의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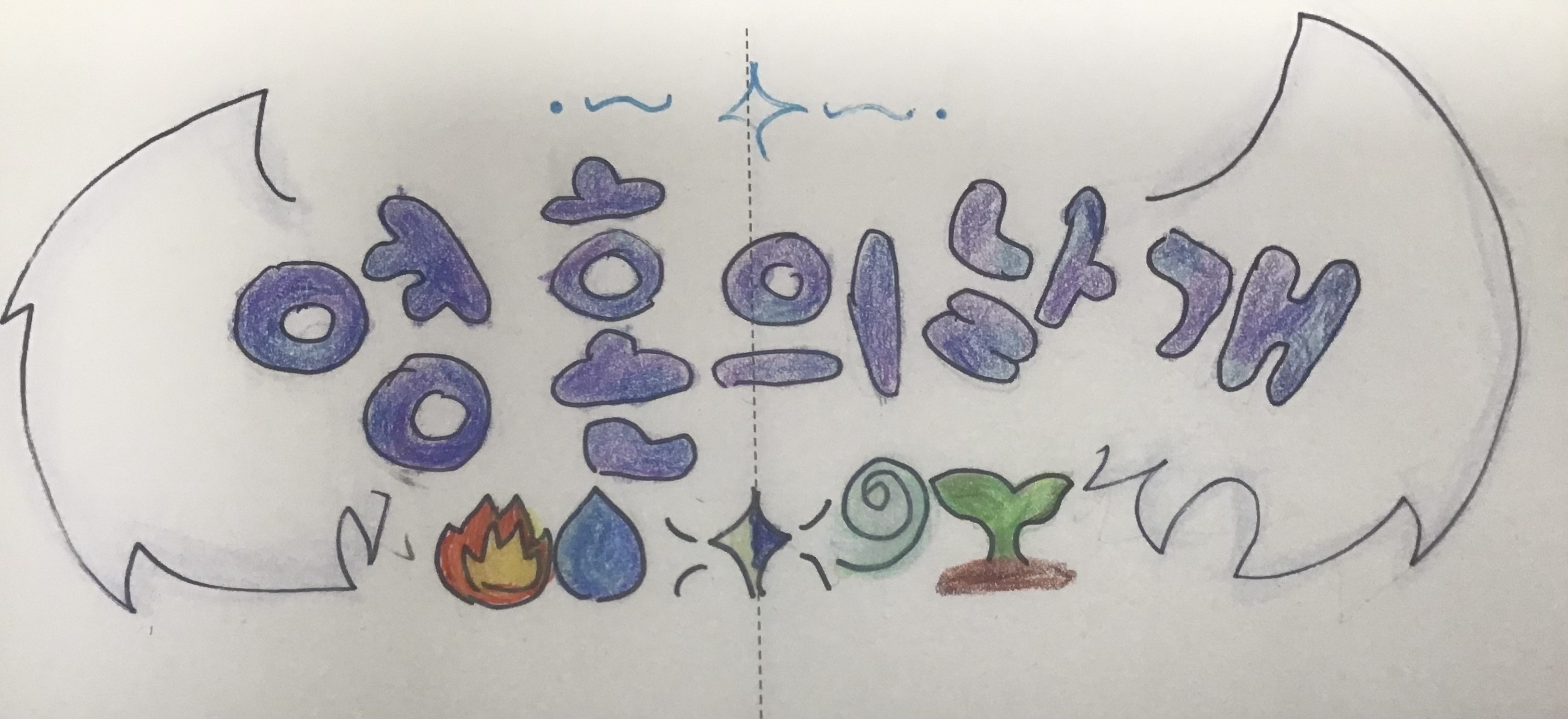
1화: 황야 위에서 뜬 두 개의 별
유타칸 대륙의 외곽, 지도가 끊긴 곳에서 시작되는 '붉은 황야'는 신의 저주가 머무는 땅이라 불린다. 지표면은 수만 년 동안 내리쬔 태양 빛에 바싹 구워져 붉은 녹슨 빛을 띠었고, 바위 틈새에선 생명의 흔적 대신 지열이 뿜어내는 기괴한 아지랑이만이 유령처럼 춤을 췄다. 습도라고는 단 1퍼센트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대기는 모든 생명체의 점막을 바짝 말려버릴 기세로 휘몰아쳤다.
그 죽음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고대 제단의 형상을 닮은 거대한 바위 위에서 들려온 미세한 균열음이었다.
카작—.
눈부시게 하얀 비늘을 연상시키는 매끄러운 알 표면에 가느다란 금이 갔다. 그 틈새로 비집고 나온 것은 태초의 빛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투명하고 노란 광휘였다.
"꺄아아...!"
첫 번째 해치, 루미나리스가 알을 깨고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어머니 용의 따스한 품이 아니라, 폐부를 찌르는 뜨거운 모래 먼지였다. 갓 태어난 해치의 연약한 점막에 건조한 공기가 닿자마자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루미나리스는 젖은 날개를 파르르 떨며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노란색과 흰색이 섞인 그녀의 비늘은 햇빛 아래서 보석처럼 반짝여야 했으나,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붉은 먼지가 내려앉아 그 빛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때, 바로 옆에 놓여 있던 회색빛 알이 요동쳤다. 껍질 안쪽에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폭발하듯 껍질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크르르..."
두 번째 해치, 그레이록이었다. 그는 태생적으로 바람의 기운을 머금고 태어난 수컷 드래곤이었다. 회색빛 비늘 사이사이로 초록색 이끼 같은 무늬가 선명했고, 그가 숨을 내뱉을 때마다 작은 회오리가 발치에서 일렁였다. 그레이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루미나리스를 바라보았다. 두 해치의 눈이 마주친 순간, 뜨겁게 달궈진 황야의 공기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번개처럼 그들을 관통했다.
하지만 감동은 짧았고, 생존의 위협은 가혹했다.
태양은 정점에 다다랐다. 바위 위는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뜨거워졌고, 루미나리스의 발바닥 비늘이 타들어 가는 듯한 치익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레이... 목이... 타들어 가..."
루미나리스가 신음하며 쓰러지듯 그레이록에게 기대었다. 빛의 속성을 지닌 그녀에게 갈증은 곧 마력의 고갈이었고, 마력의 고갈은 곧 죽음이었다. 루미나리스의 눈동자에 서린 노란 빛이 점점 흐릿해지며 초점을 잃어갔다.
그레이록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바람의 드래곤이었으나, 그 이전에 신화 속 거인과 같은 지치지 않는 생명력을 타고난 존재였다. 그의 골격은 해치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고, 근육은 질긴 밧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도 루미나리스를 지탱하며 앞발을 내디뎠다.
"버텨야 해. 저 너머에... 바람이 전해주는 습기가 느껴져."
그것은 자비 없는 황야가 보여주는 신기루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레이록은 루미나리스를 자신의 등 위로 올리다시피 하며 기어갔다. 날카로운 바위 조각이 발톱을 파고들고, 뜨거운 모래가 피부를 태워도 그레이록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등에 기댄 이 연약한 빛의 동반자가 영영 꺼져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그레이록의 입술은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 피조차 흐르기도 전에 말라붙었다. 루미나리스의 호흡은 점점 옅어졌다. 그녀의 몸은 이제 열기에 익어가는 듯 뜨거워졌고, 고귀했던 흰 비늘은 생기를 잃은 석회 가루처럼 푸석해졌다.
결국, 거대한 붉은 모래언덕 아래에서 그레이록의 무릎이 꺾였다.
쿠웅.
엄청난 체력을 자랑하던 그레이록이었지만, 물 한 방울 없는 폭염 아래 수 킬로미터를 해치의 몸으로 버티는 것은 신조차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모래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그레이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루미나리스의 앞발을 쥐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의식이 암전되려던 찰나였다.
루미나리스의 가슴 깊숙한 곳, 아모르가 심어놓은 태초의 마력 핵이 요동쳤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터져 나온 생명의 비명이자, 유타칸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루미나리스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실핏줄 같은 노란 빛이 새어 나오더니, 이내 폭발적인 광휘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안 돼... 절대로... 지지 않아...!"
루미나리스의 외침은 소리가 아닌, 신성한 파동이 되어 황야를 흔들었다.
그녀의 몸 주변으로 황금빛 불꽃들이 소용돌이치더니, 이내 거대한 빛의 장벽이 두 해치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어떠한 기술도, 주문도 아니었다. 오직 살고자 하는 처절한 갈망과 아모르의 신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적의 보호막이었다.
보호막 안쪽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며 서늘하고 정화된 기운이 감돌았다. 루미나리스는 마지막 남은 마력뿐만 아니라 영혼의 불꽃까지 태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늘 사이사이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구름 한 점 없는 유타칸의 하늘을 향해 거대한 기둥이 되어 솟구쳤다.
하늘을 찌를 듯한 백금색의 빛기둥.
그것은 메마른 대지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죽어가는 영웅들이 세상에 내지르는 유일한 구조 신호였다. 루미나리스의 의식은 그 빛 속에 녹아들어 점차 멀어져 갔지만, 그녀의 빛줄기만은 황야의 지평선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며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멀리서, 지평선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는 무언가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